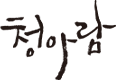온도 측정 장비, 온도계

뜨겁다 혹은 차갑다고 말할 때 사람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다. ‘무엇이 더 뜨겁고, 무엇이 더 차갑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하나의 물건이 아닌 수치로 정한다면, 모두가 공통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프랑스에는 약 25만 가지의 길이, 부피, 무게 측정 단위가 있었다고 한다. 사람마다 측정 단위가 달라 서로 다른 양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곤 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단위인 미터법은 1889년 제1회 국제도량형총회에서 미터와 킬로그램의 국제원기가 승인되면서
확립됐다.
우리나라는
1959년 국제미터협약에 가입한 후, 1961년에 ‘계량법’을 제정해 법정계량의 기본단위로 미터법을 채택했다. 이후 1964년부터 미터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많은 단위 중 온도는 원시 인류부터 자연과 계절, 신체에서 감각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사람은 온도 변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해 왔고, 이를 측정하려는
노력도 계속했다. 그렇다면 온도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역사는 꽤 오래됐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온도계를 만든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그 이전에도 온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유사한 장치들이 존재했지만, 16세기 갈릴레오의 온도계가 최초로 인정받고 있다. 갈릴레오 온도계는
공기의 밀도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활용해 온도의 변화를 측정했다. 이 장치는 물이나 포도주가 담긴 유리 구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면서 물의 높이를 통해 온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물체의 온도 변화 정도를 알 수 있었을 뿐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온도계에 눈금을 추가한 사람은 산토리오 산토리오였다. 그는 온도계를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눈금을 넣어, 온도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온도계는 계속해서 발전했지만,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가 되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온도계는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웠다. 일부 의사들은 온도계를 사용했지만, 19세기 중반까지도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려면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온도계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온도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전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정밀한 온도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온도 섭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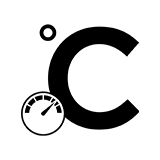
온도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섭씨온도(℃)는 1742년 스웨덴의 천문학자이자 과학자인 안데르스 셀시우스(Anders Celsius)가 고안한 온도 체계다. 셀시우스는 같은 기압에서 물의 어는점과 끓는점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도 체계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지금과 반대로 물의 끓는점을 0℃, 물의 어는점을 100℃로 설정하고, 이 사이를 100등분해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와 반대인 셈인데, 역사학자들은 셀시우스가 살던 스웨덴의 추운 날씨에서 영하 온도를 자주 측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온도가 정반대로 바뀌었을까? 셀시우스는 온도 체계를 고안한 후 불과 2년 만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의 친구이자 식물학자인 칼 폰 린네(Carl von Linn)가 셀시우스의 온도 체계를 뒤집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로 바꿨다. 린네가 온도를 반전시킨
이유는 셀시우스의 발상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식물학자로서 식물의 생태와 보존을 중시했기 때문이었다. 식물들이 힘들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해, 물이 어는점인 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의 섭씨온도가 형성됐다.
섭씨온도의 시작은 셀시우스의 발상에서 출발했지만 식물학자인 린네의 실용적인 고려에 의해 바뀐 온도 체계다.
섭씨온도의 단위인 ℃는 셀시우스(A. Celsius)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런데 ‘섭씨’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셀시우스의 온도 체계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그의 이름이 한자로 바뀌었고, 중국어로 ‘섭이사(攝爾思)’라고 불리게 됐다. 이후 이 표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섭씨(攝氏)’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섭씨라는 말은 결국 사람의 성인 거다.
안녕하세요 Mr.화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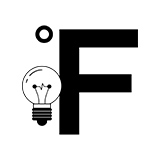
섭씨온도가 등장하기 전에 존재했던 온도 체계 중 하나가 바로 화씨온도다. 화씨온도는 네덜란드 태생의 물리학자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Daniel Gabriel Fahrenheit)가 고안한 온도 체계다. 여기서도 유추해 본다. 혹시 다니엘 가브리엘 파렌하이트의 성이 ‘화씨’가 아닐까라고 말이다. 그렇다. 중국에서 그의 이름은 ‘화륜해특(華倫海特)’으로 쓰여 우리나라에서 ‘화씨(華氏)’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파렌하이트(Fahrenheit)의 첫 글자인 F를 따 기호는 °F로 표기한다.
파렌하이트는 1909년 알코올 온도계, 1714년 수은 온도계를 발명했다. 화씨온도는 그가 수은 유리 온도계를 처음 발명할 때 사용했던 온도 단위다. 1기압에서 물의 어는점 32°F와 끓는점 212°F 사이를 180등분해 온도 단위의 기준을 세웠다. 이후 1724년, 그는 세 개의 고정된 온도 지점을
설정했는데, 첫 번째는 물, 얼음, 소금(염화나트륨)의 혼합물인 소금물이 안정화되는 지점인 0°F, 두 번째는 물이 어는점인 32°F, 세 번째는 사람의 체온인 96°F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화씨온도가 발전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물이 끓는 온도는 212°F가 된다.
참고로 우리는 36.5℃/℉를 읽을 때 ‘섭씨 36.5도’, ‘화씨 36.5도’로 읽는다면 서양에서는 ‘36.5 디그리(Degree) 셀시우스’, ‘36.5 디그리 파렌하이트’로 읽는다. 섭씨와 화씨는 우리나라만의 읽는 방법이다.
단위의 기본 켈빈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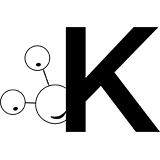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온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섭씨온도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기준이 되는 온도 단위는 켈빈온도(K)다.
켈빈온도는 국제단위계(SI)의 일부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도량형 체계를 말한다. 국제단위계는 전류, 온도, 시간, 길이, 질량, 광도, 물질량 등 7개의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 그리고 19개의 조합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제단위계는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합의한 기준
단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온도에 해당하는 국제단위계는 켈빈온도다. 켈빈온도는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물질을 이루는 원자와 분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절대 0도(0K)를 기준으로 한다. 절대 0도는 물질의 원자와 분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온도에서 물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켈빈온도에서
절대 0도 이하의 온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0도는 가장 낮은 온도다.
켈빈온도의 기호 K는 윌리엄 톰슨의 별칭에서 유래했다. 윌리엄 톰슨은 열역학 분야에서 일과 에너지 관계를 연구해 중요한 공로를 세운 학자로, 이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았고, 그 작위명이 ‘켈빈’이다. 켈빈은 그가 근무한 글래스고 대학교 앞을 흐르는 강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참고로, 윌리엄 톰슨이
절대온도의 개념을 제안한 시기는 24세였고, 그가 켈빈경이 된 나이는 42세였다. 그는 후계자가 없어 제1대이자 유일한 켈빈경이 됐다.
켈빈온도의 기준인 0K는 에너지 총량이 0인 지점으로, 섭씨온도로는 -273.15℃, 화씨온도로는 -457.87°F에 해당한다. 또한 섭씨온도에서 1℃의 온도 차이는 켈빈온도에서 1K의 온도 차이는 같다. 즉 켈빈온도는 섭씨온도에 273.15를 더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켈빈온도의 기준은 물, 얼음,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고유한 온도인 물의 삼중점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자들은 물리상수를 바탕으로 볼츠만 상수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물이란 물질이 아닌 물리적 특성에 의한 온도의 정의를 새롭게 했다. 이 새로운 정의는 2019년 5월 20일부터 적용됐고 과학적
정의가 변화했지만, 우리 일상에서 변화는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