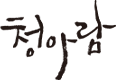기본 단위가 합쳐진 유도 단위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단위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번 호의 주제인 ‘속도(m/s)’의 단위 기호는 기존 단위들과 다르게 2개의 단위 기호가 합쳐진 모습이다. 그동안의 테마였던 온도(K), 질량(kg), 길이(m), 시간(s)은 국제단위계(SI)에서 ‘기본 단위’로 불린다. 총 7개의 기본 단위는 앞서 언급한 4개와 전류(A), 물질량(mol), 광도(cd)로, 모든 단위의 기본이 된다. 이런 기본 단위를 조합하면 마치 레고처럼 더 많은 물리량을 만들 수 있는데, 기본 단위를 곱하거나 나누어 얻는 것이 ‘유도 단위’다.
힘의 단위 N(뉴턴)을 예로 들어보자. 뉴턴은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를 1m/s2만큼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으로 정의된다. 즉, N은 질량 단위 kg, 길이 단위 m, 시간 단위 s가 곱해지고 나눠지는데, 이를 표현하면 ‘1N=kg·m·s-2’이다. 속도는 단위
시간마다
위치(길이)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뜻하므로 m/s로 표기한다. 단위에는 크기를 조절하는 접두어도 붙는데, 속도에서 가장 친숙한 접두어는 1,000배를 뜻하는 kilo(k)다. 그래서 길이를 ‘미터’가 아닌 ‘킬로미터’로 바꿔 적는 방식이 자연스러워 일상에서는 시속을 나타내는 km/h도 자주 쓴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는 크기인 가속도는
m/s2로 표기된다.
국제단위계에는 표기법의 규정이 있다. 숫자와 단위 기호 사이는 한 칸 띄어 32 °C, 9.8 m/s²처럼 쓰는 것이 원칙이다(평면각의 도·분·초는 예외적으로 붙여 쓴다). 단위 기호가 여러 개 겹쳐 쓸 때는 기호 사이에 가운뎃점이나 빈칸으로 두어야 하기에 ‘20 kg m/s2’로 쓴다.
퍼센트(%)는 SI
단위는 아니지만, 기호로 쓸 때 원칙상 25 %처럼 띄어 써야 한다. 인명에서 딴 단위 기호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고(A, K 등), 리터는 소문자 l과 숫자 1의 혼동을 피하려 예외적으로 대문자 L을 허용한다. 단위 이름을 영문으로 적을 때는 보통 소문자를 쓰되, Celsius처럼 고유명에서 온 경우는
대문자를 유지한다. 단위 기호는 기울임체를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헌에는 거의 이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의 <청아람> 지면에서는 독자 친숙도를 고려해 붙여서 써왔다. 다만 원칙은 위와 같으니 문서에서 보더라고 잘못 쓴 게 아님을 인지하자.
조선 병사의 행군 속도는 시속 1.5km?

조선 시대는 오늘날의 m/s 같은 속도 단위가 없었다. 대신 거리를 기본 요소로 삼아 일상생활이나 군사, 행정에서 활용했다. 그 단위가 바로 보(步), 리(里)다. 조선 시대의 주척(도량형 기구)은 약 20.8~21cm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1보는 6척(약 1.2m), 1리는 360보, 약 432m로 환산했다. 이 단위는 도로 거리 측정, 군대 행군, 교통로 표시 등에 쓰였고, 30리마다 1역(驛)을 두어 이동 거리와 시간을 가늠했다. 이러한 표준화는 세종 때 자리를 잡았다.
문헌 《행군수지》, 《조선왕조실록》 등에 따르면 ‘조선 병사들은 인시(오전 3시~5시)에 아침밥을 먹고 묘시(오전 5시~7시)에 군장을 메고 하루 약 30리를 행군했고, 모든 일정은 미시(오후 1~3시)에 마무리됐다’라고 한다. 30리는 약 12.96km로 총 8시간 동안 걸었다고 보면 병사들의 평균 속도는
대략 1.5km/h 정도가 된다. 요즘 육군 병사가 대략 20kg 배낭을 메고 4km/h 정도를 걷는 것과 비교하면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의 도로 사정과 군장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속도가 아닐까?
세종 대에는 속도(정확히는 거리)를 ‘소리’로 알려주는 발명품도 등장한다. 세종 23년(1441년)에 장영실이 발명했다고 추측되는 기리고차(記里鼓車)다. 기리고차는 말이 끄는 수레에 바퀴 회전수를 톱니바퀴로 환산해 일정 거리를 갈 때마다 종과 북이 울리게 한 반자동 거리계다. 예컨대 ½리마다 종 1번,
1리마다 종 여러 번, 5리마다 북 1번, 10리마다 북 여러 번이 울리도록 설계했다. 기리고차를 타고 경복궁에서 온양온천까지 갔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두 지점을 약 120km로 계산한다면 10리는 4.32km이니 북이 최소 약 28번 울렸지 싶다. 그 속도로 온양까지 가면 어느 정도 걸렸을까? 병사 기준
시속 1.5km로 하루 8시간 행군하면 약 12km/일, 10일 안팎이 필요했을 것 같다.
끝없이 올라가는 속도 마하

항공기의 속도는 보통 마하(Mach)로 표현한다. 마하는 공기 중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음속을 넘을 때 주변 공기가 겪는 변화(충격파)를 연구한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Ernst Mach)의 이름에서 따왔다. 마하를 이해하려면 음속을 알아야 한다. 음속은 소리가 퍼져 나가는 빠르기인데, 해수면의 표준 조건(기온 15℃, 기압 1기압)에서는 대략 초속 340m, 시속으로는 약 1,224km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치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기의 온도와 성질, 그리고 매질이 달라지면 음속도 함께 변한다. 같은 마하 1이라도 지상과 높은 고도, 공기와 물속에서의 실제 km/h 값은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항공우주공학에서는 절대 속도보다 ‘그곳의 음속과 비교한 빠르기’인 마하수(Mach number)를 쓴다. 마하 1은 해당 환경의 음속과 같은 속도, 마하 0.5는 그 절반, 마하 2는 두 배 빠름을 뜻한다. 즉, 표준 조건에서는 마하 1이 약 340m/s지만, 기온이 낮은 상공에서는 그보다 작거나
클 수 있다. 비행기가 마하 1 근처로 다가가면(대략 마하 0.8~1.2 구간) 기체 표면 일부에서 먼저 음속을 넘는 구간이 생기고, 이때 공기가 급격히 눌리며 충격파가 나타난다. 마하 1을 넘어 초음속으로 비행하면 또렷한 충격파 구조가 형성되고, 그 파동이 지상까지 이어질 때 특유의 굉음인 소닉붐이
들린다.
음속 구간은 보통 아음속, 천음속,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나눈다. 아음속(Subsonic)은 마하 0.3~0.8(대략 약 370~980km/h) 정도로, 공기가 크게 눌리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이다. 다수의 여객기가 이 구간을 비행한다. 천음속(Transonic)은 마하
0.8~1.2(980~1,470km/h)로, 기체 주변에 느린 공기와 빠른 공기가 동시에 생겨 부분적인 충격파가 나타나고, 양력과 항력이 갑자기 달라지는 구간이다. 일부 고속 여객기가 이곳을 비행한다. 초음속(Supersonic)은 보통 마하 1.2~5(약 1,470~6,125km/h)다. 이 구간은 뚜렷한
충격파가 만들어지며 항력이 많이 늘어나기에 항공기는 뾰족한 기수와 얇은 날개, 강한 엔진 같은 초음속용 설계를 갖춰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초음속을 나는 전투기의 모양이 결정되며, 일반 여객기가 초음속 구간에서 비행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극초음속(Hypersonic, 마하 5 이상, 시속 약
6,125km)은 공기가 매우 뜨거워지고 성질까지 변해 열 보호와 특수 추진(램·스크램제트 등)이 필요하다. 최근 극초음속 무인기, 스크램제트 추진 기술을 적용한 극초음속 비행체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지닌 빛

스위치를 ‘딸깍’ 켜는 순간 방 안이 곧장 밝아지는 건, 빛이 우리의 인지보다 훨씬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c)는 299,792,458m/s, 1초에 지구를 약 7.5바퀴 도는 어마어마한 값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이 속도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을 수 없다. 현재까지 우주에서 ‘최고 속도’의 자리는 빛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고대에는 엠페도클레스가 빛에 속도가 있다고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순간적이라고 여겼다. 긴 논쟁 끝에 1638년 갈릴레이는 두 산봉우리 사이에서 등불을 여닫으며 왕복 신호 시간을 재려 했지만, 관측된 반응은 사실상 동시에 나타났다. 그는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고 단정하기보다, 당대의 장비로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르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수치를 제시한 이는 덴마크의 천문학자 올레 뢰머였다. 그는 목성의 위성 이오가 목성의 그림자에 들어가는 시각이 지구–목성 거리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분석해 빛의 속도를 약 220,000,000m/s로 추정했다. 현재 밝혀진 빛의 속도보다는 느리지만 약 300년 전의 과학 기술을 감안한다는
놀라운 발전이다. 이어 프랑스의 아르망 피조는 지상에서 빛을 왕복시키며 걸리는 시간을 정밀 장치로 측정해 약 313,000,000m/s라는, 오늘날 값에 매우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
1975년 제15차 CGPM(제도량형총회)은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빛의 속도를 299,792,458m/s로 권고했고, 1983년 제17차 CGPM은 아예 미터의 정의를 “빛이 진공에서 1/299,792,458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재정의했다. 그 순간부터 c는 정의로 고정된 정확한 상수가 됐고, 길이
단위인 미터가 그에 맞춰지는 구조가 됐다. 빛의 속도 c는 자연이 정한 최고 속도의 한계이자, 우리가 쓰는 길이와 시간의 기준 축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