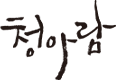천둥과 번개의 속도 차이는?
비가 잦은 시기인 여름과 가을이면 하늘이 번쩍인 뒤 잠시 있다가 우르르 쾅쾅 소리가 따라온다. 분명 한 하늘 아래 동시에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는 언제나 번개를 먼저 보고 천둥을 나중에 듣는다. 왜 그럴까? 이 차이는 천둥과 번개의 정의에서 알 수 있다. 천둥은 ‘번개로 인해 발생한 소리’이고, 번개는 ‘대기
중에 방전되며 생기는 강력한 빛’이다. 여기서 방점은 소리와 빛이다. 즉, 소리와 빛의 속도 차이 때문이다.
빛은 공기 중에서 약 3×108m/s로 이동하는데, 이는 자연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소리는 약 340m/s로 빛보다 약 882,000배 느리다. 이 압도적 속도 차이로 우리는 천둥과 번개를 동시에 만날 수 없다. 이 속도를 알았으니, 번개가 친 곳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대략 계산할
수 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약 7.5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빨라서 우리가 번쩍임을 보는 순간은 거의 0초 정도다. 천둥은
1초에 약 340m를 이동하니, 번개가 친 후에 3초 뒤 천둥이 들렸다면 1km 거리에서 번개가 친 것이다. 만약 번개와 천둥의 간격이 거의 없다면 바로 우리 근처에서 일어난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몸을 피해야 한다. 이때 나무 밑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나무는 뾰족하고 높아 번개를 끌어당기는 피뢰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리와 빛의 속도 차이가 생기는 현상은 일상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매년 가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불꽃축제에서도 볼 수 있다. 불꽃이 하늘에서 터지고 몇 초 후에 ‘펑’하고 소리가 들린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시즌
10호 골을 터트린 손흥민 선수의 발과 골이 만날 때 내는 소리와 장면을 현장 관중은 어긋나게 봤다. 이는 관중석이 수백 미터 떨어졌기 때문이다. 콘서트장에서 음향이 미묘하게 늦게 들리는 것도 같은 원리다. 무기체계에서도 일어난다. K9자주포와 K2전차의 시연 장면을 보면 포탄이 터지는 모습이 보인 후 잠시
후 ‘쾅’하는 폭음이 들린다. 전투기의 소닉붐 역시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보다 늦게 우리 귀에 도달한다.

속도의 한계에 도전하는 스포츠의 세계
스포츠는 속도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올림픽 모토마저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다 함께(Faster, Higher, Stronger – Together)’로 인간은 끊임없이 ‘더 빠른 순간’을 꿈꾸고 있다. 올림픽 구기 종목에서 가장 빠른 건 배드민턴이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인도 사트위크사이라즈
란키레디 선수의 스매시 속도인 시속 565km가 가장 빠르다. 이는 (물론 순간의 속도와 비교하는 건 무리지만)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보다 약 두 배나 빠르다. 셔틀콕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가벼운 무게와 물리 법칙 덕분이다. 4.74~5.5g 정도에 불과한 셔틀콕은 뉴턴의
제2법칙 F=ma(가속도의 법칙)를 그대로 증명한다. 질량이 작을수록 같은 힘에서 가속도는 커진다. 즉, 강한 스매시 한 방이 셔틀콕을 순간적으로 빛보다 빠르게(물론 상대적으로) 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셔틀콕의 깃털 구조가 공기저항을 조절해 안정된 회전과 비행 궤도를 만들어내며, 이것이 다른 구기
종목 공의 속도와 차별되는 이유다. 그 뒤를 잇는 종목은 골프다. 2002년 ‘리맥스 월드 롱 드라이브 챔피언십’에서 미국의 라이더 윈더가 기록한 골프공 속도는 시속 349.3km, 공은 약 469야드(428.9m)를 날아갔다. 기네스북 기준으로 테니스는 263km/h, 야구는 197km/h, 럭비는
77km/h가 최고 속도로 기록되어 있다.
속도를 논할 때 육상 100m를 빼놓을 수 없다.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는 평균 시속 37.58km/h로 질주해 9.58초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특히 65m 지점에서는 시속 44.7km까지 속도를 끌어올렸다. 함께 뛴 타이슨 게이는 9.71초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그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1km. 우사인 볼트의 속도를 동물과 비교하자면 코끼리(시속 25km)보다는 빠르지만, 하마(시속 50km)보다는 느리다. 장거리에서는 케냐의 켈빈 킵툼이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2시간 0분 35초로 세계 기록을 세웠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의 손기정 선수 기록인 2시간 29초
19초와 비교하면 인간의 한계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2시간 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물속은 어떨까? 자유형 50m 세계 기록 보유자 세자르 시엘루 필류는 20.91초 만에 레인을 완주했다. 이는 시속 약 8.6km로, 느려 보이지만 물의 저항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참고로 가장 느린 물고기인 해마는 1km를 이동하는 데 3일이 걸리고, 그린란드 상어는 시속 1km 정도로 움직인다. 결국
모든 바다 생물보다 사람이 느린 건 아니다.
빙상 위에서는 도구가 인간의 한계를 끌어올린다. 스피드스케이팅 1,000m의 최고 기록은 1분 05.37초, 평균 시속 약 55.1km/h에 달한다. 500m 부문에서는 이상화 선수가 세운 36.36초(시속 약 49.5km/h)가 여전히 레전드로 남아 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속도
눈에 보이는 모든 움직임이 빨라 보이지만, 정작 가장 놀라운 속도는 우리 몸안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심지어 잠들어 있을 때조차 몸속은 끊임없이 질주 중이다.
가장 쉽게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심장이다. 두근두근 바운스 치는 심장은 매일 약 96,000km의 혈관에 혈액을 보낸다. 이 혈액이 몸속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심장이 한 번 뛸 때 약 70mL의 혈액을 내보내며, 1분에 약 70번 정도 박동한다. 심장은 1분 동안
4,900mL의 혈액을 만드니, 거의 5L에 가까운 혈액이 1분 동안 96,000km를 이동한다.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혈액은 시속 576×106km, 초속 약 1,600km의 속도로 움직인다. 이는 KTX보다, F1 경주차보다도 빠른 속도다.
우리 몸의 또 다른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신경계다. 가장 빠른 신경 전달 속도는 초당 118m/s, 시속 약 425km에 달한다. 이 신호는 뇌와 척수에서 근육으로 전달되어, 우리가 ‘움직이고자’ 생각한 순간 이미 몸이 반응하도록 만든다. 반대로 통증 신호는 훨씬 느리다. 예를 들어 발을 헛디뎌 다쳤을
때 ‘아!’ 하고 느끼기까지 몇 초가 걸리는 이유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섬유의 속도(시속 약 1.8~7.2km/h)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눈을 깜빡이는 속도는 어떠한가. 우리는 한 번 눈을 깜빡이는 데 보통 0.3초 안팎이 걸리고, 4~5초마다 한 번 정도, 즉 분당 12~15번 깜빡인다. 눈의 평균 세로 크기는 약 1.1cm 정도여서 이를 기준으로 잡으면 눈꺼풀의 평균 이동 속도는 대략 3~5cm/s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눈은 세상을 필터링하며 다음 장면을 본다. 재채기 속도도 빠르다.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 속도는 초당 4~15m(시속 14~54km) 정도다. 기네스북에는 무려 초당 46.4m(시속 167km)의 기록도 있다. 게다가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의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나 기침으로 배출된 비말은 최대 8.2m까지
날아가며, 속도는 초당 10~30m(시속 36~110km)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인체의 속도 중 느린 건 소화 과정이다. 음식이 입에서 항문까지 이동하는 데 위에서 2~5시간, 소장에서 4~8시간, 대장에서 10~20시간으로, 평균 약 24시간이 넘게 걸린다. 총이동 거리를 약 7m로 계산하면 음식물은 초당 0.08mm 정도로 천천히 움직인다. 이 느린 여정 덕분에 우리는 영양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얻는다.

빠르기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
음악에서 속도는 템포(Tempo)라 부른다. 이탈리아어로 ‘시간’을 뜻하는 템포는 한 곡이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연주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단위는 분당 박자 수인 BPM(Beats Per Minute)이다. 이를테면 120BPM은 1분에 120번의 비트가 울린다는 뜻이다.
시대별로 다양한 음악이 존재하듯 그에 따른 템포도 변화와 기준이 다양했다. 오늘날까지 널리 쓰이는 방식은 이탈리아식 표기다. Largo는 아주 느리고 웅장하게, Adagio는 차분히 느리게, Andante는 걷는 속도로 자연스럽게, Moderato는 보통 빠르기로, Allegro는 빠르고 활기차게,
Vivace는 매우 생기 있게, Presto는 눈 깜짝할 사이처럼 매우 빠르게를 의미한다. 여기에 molto(아주), più(더), meno(덜), assai(매우), non troppo(너무 ~하지 않게) 같은 수식이 붙어 미세한 속도 뉘앙스를 만든다. 연주 중간에 속도를 바꾸는 지시도 존재하는데,
ritardando(rit.)나 rallentando(rall.)는 점점 느리게, accelerando(accel.)는 점점 빠르게, a tempo는 원래 속도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rubato는 박을 살짝 늘였다 줄였다 하며 감정선을 살리는 표현으로, 클래식부터 발라드까지 폭넓게 쓰인다.
장르별로 선호하는 템포에는 경향이 있다. 발라드와 R&B는 60~90BPM에서 여백을 크게 확보하고, 붐뱁 힙합은 85~95BPM으로 묵직한 드럼 그루브를 만든다. 트랩은 표기상 130~150BPM이지만 하프타임 구조로 체감은 65~75BPM에 가깝고, 팝과 K-팝 댄스는 100~130BPM에서 경쾌함을
끌어낸다. 클럽의 하우스는 120~128BPM으로 꾸준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드럼 앤 베이스는 160~175BPM의 고속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킨다. 실제 곡을 살펴보면 뉴진스 ‘Super Shy’는 약 130BPM으로 미니멀한 편성에 질주감을 얹고, 방탄소년단 ‘Dynamite’는 약 150BPM, 아이브
‘Love Dive’는 약 120BPM, 테일러 스위프트 ‘Anti-Hero’는 약 97BPM이다. 음악에 따라 속도를 달리해 연주된다.
결국 템포는 숫자 이상의 언어다. 느린 템포는 여백과 여운을 늘려 감정을 깊게 만들고, 중간 템포는 가사와 멜로디를 또렷하게 들리게 하며, 빠른 템포는 설렘과 흥분, 집중력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운동과 페스티벌에는 빠른 템포가, 밤 산책이나 집중 공부에는 중·저속 템포가 잘 어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