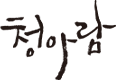질량과 무게는 다르다?
사람들이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무게와 질량이다. 같은 말 아니냐고? 아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이 다르다. 질량은 어떤 물체가 가진 물질의 양, 즉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이다. 반면 무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질량은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지만, 무게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무게는 물체의 성질이 아니라 그 물체를 지구(혹은 다른 천체)가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질량이 크면 무게도 커진다. 이건 직관적이다. 하지만 두 개념은 분명 구분되는데 단위부터 다르다.
질량의 단위는 kg(킬로그램)을 쓰지만, 무게는 kgf(킬로그램힘, 킬로그램중)나 N(뉴턴)으로 표현된다. 이 ‘뉴턴(N)’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고 뉴턴은 1kg의 물체를 1m/s²의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한다.
지구에서 질량이 10kg인 물체를 달로 가져가도 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10kg이다. 하지만 달의 중력은 지구의 1/6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물체라도 무게는 1/6이 된다. 예를 들어, 60kg 질량을 가진 사람이 달에서 몸무게를 재면 약 10kg 정도로 나온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긴다.
몸무게도 질량의 단위인 kg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그건 편의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몸무게는 ‘60kg 질량의 사람이 지구 중력에서 받는 힘’이다. 즉, 60kgf 또는 588N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표기하지 않고 그냥 ‘kg’로 통일해서 쓰는
것뿐이다.
어떻게 무게와 질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 질량을 재려면 분동과 접시저울이 필요하다. 양쪽 접시에 물체와 분동을 올려서 수평을 맞춘다. 이때 맞춰진 분동의 질량이 곧 물체의 질량이다. 반면, 무게는 용수철저울이나 전자저울처럼 중력에 반응하는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다. 중량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는 데 중량은
무게와 같은 뜻이다. 단지, ‘무게’는 순우리말, ‘중량’은 한자어일 뿐. 표현만 다르고, 개념은 같으니 헷갈리지 마시길.

무엇보다 빛나는 질량 단위는?
단위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사용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무게를 쟀다. 그 기준이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보리 낱알 200개를 모아 1베카(Beqa)로 정하고, 사금의 무게를 재는 데 썼다. 우리나라에서도 쌀 한 가마니가
질량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식물들 가운데, 단연코 가장 빛나는 물질의 무게를 재는 데 쓰인 단위가 있다. 바로 캐럿(Carat)이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다. 캐럿이라는 단위는 캐럽나무(Carob tree)에서 유래했다. 이 나무는 지중해 지역에 자생하며, 성경에도 등장한다. 성경에서는
쥐엄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궁핍의 상징이기도 했다. 먹을 게 없던 시절,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라던 쥐엄나무 열매는 삶아서 죽처럼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생존 자원이었다. 이 캐럽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아랍 상인들을 통해 그리스,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스페인, 이베리아반도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까지 퍼져 나갔다. 지역마다 이름은 달라져 이탈리아에서는 carrubo, 영어권에서는 Carob으로 불렸다.
그 씨앗이 캐럿(Carat)이란 단위가 된 이유는 간단하다. 씨앗 하나의 질량이 0.2g 내외로 거의 균일했기 때문이다. 저울이 없던 시절, 질량의 표준이 되는 씨앗이 상인들 사이에서 ‘1캐럽, 2캐럽’이라고 부르던 것이 무게의 단위가 된 것이다.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캐럿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건
16세기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1907년, 국제적으로 1캐럿=0.2g으로 단위가 고정됐고, 지금은 ‘ct’라는 단위 기호로 표기된다.
흥미롭게도, 같은 ‘캐럿’이라 불리지만 철자가 다른 단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Karat’, K로 시작하는 캐럿이다.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닌 ‘금(Gold)’에 사용되는 단위다. 금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해서 만든다. 그래서 얼마나 순금이 섞여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그
순도, 금의 함량 비율을 표시하는 단위가 바로 캐럿(Karat)이다. 이 단위의 어원도 캐럽 씨앗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왜 24K가 ‘순금’을 의미할까?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말린 캐럽 씨앗을 어른 손으로 한 줌 쥐면 대략 24개라는 설과 또 하나는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 금화의 무게가 24실리케(siliquae)였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여기서 24K는 금의 순도 100%, 18K는 24분의 18,
즉 75%의 순금, 14K는 24분의 14로 58.5%의 순금이 포함된 합금이라는 뜻이다.
금에 관련된 단위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단위가 있다. 바로 ‘돈’이다. 돈은 귀금속이나 한약재에 사용하는 전통 단위로, 당나라 시대의 동전에서 유래됐다. 그렇다면 1돈의 무게는 얼마일까? 24K 기준으로 1돈은 3.75g이다. 만약 금 보증서에 7.5g이라고 적혀 있다면, 2돈 어치 금이라는 의미다.

무거운 고래는 왜 가라앉지 않을까?
지구 역사상 가장 무거운 동물은 1947년 남극해에서 잡힌 대왕고래라는 기록이 있다. 무려 190t에 이른다. 이런 기록을 깬 발견이 2023년 페루 남부 사막에서 있었다. 무려 3,900만 년 전, 이미 멸종된 고래의 일종이었고, 화석은 ‘페루세토스 콜로서스(Perucetus
colossus)’로 이름 붙여졌다. 발견된 척추 13개, 갈비뼈 4개, 엉덩이뼈 1개 등으로 추정한 결과, 이 고래의 무게는 최소 85t~340t에 이르렀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고래는 왜 바다에 가라앉지 않았을까? 어떻게 바다 위를 유영할 수 있을까? 비밀은 바로 ‘바다’라는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부력에 있다. 지구 어디든 중력이 작용하는 건 맞지만, 액체 속 특히 바닷속에서는 중력에 반대하는 힘이 하나 더 생긴다. 그게 바로 부력이다. 부력은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 작용하는 힘이다. 즉, 물속에 담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그 부피만큼 물이 밀려 나가고, 그 무게만큼 위로 미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고래는 어떻게 물에 뜨는 걸까? 고래의 뼈는 속이 텅 비어 있다. 뼛속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골밀도가 낮아진다. 뼈가 가벼워지면
당연히 몸 전체의 무게도 줄어들고, 부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또 고래는 에너지 저장과 체온 유지를 위해 피하에 지방층을 두껍게 갖고 있다. 이 지방은 물보다 가볍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고래일수록 물에 더 잘 뜬다. 이처럼 고래는 가벼운 뼈와 부력을 받는 지방층을 조절하면서 어마어마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물고기 역시 같은 구조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부레라는 공기주머니로 조절한다. 이 부레에 공기를 더 넣으면 부력이 커져 뜨고, 공기를 빼면 무게가 더해져 가라앉는다. 마치 다이얼을 돌리듯, 자신이 있는 깊이에 따라 몸의 밀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셈이다.
단지 생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니다. 같은 원리가 잠수함, 함정(전함, 군함 등)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함정은 선체의 부피가 매우 크다. 그래서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상당한 부력을 가진다. 여기에 중량(무기, 장비, 인원 등)을 더할 수 있는 한계는 결국 함정의 부피와 밀도에 따라 결정된다.
잠수함은 그보다 더 정밀하게 설계된다. 탱크 안에 공기를 채워서 부력을 높이면 떠오르고, 그 공간에 물을 채워 무게를 늘리면 가라앉는다. 필요할 때는 압축 공기로 물을 밀어내고,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다.

피사의 사탑은 왜 무너지지 않지?
이탈리아를 여행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들르게 되는 명소가 있다. 바로 피사의 사탑. 탑 자체보다 더 유명한 건, ‘기울어 있다’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짜 궁금한 건 이거다. “이렇게 무겁고 기울어진 탑이 왜 아직도 안 무너지는 걸까?” 이 탑의 무게는 무려
14,500t. 거의 대형수송함 마라도함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수 세기를 견디고, 아직도 멀쩡히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을까?
사실 피사의 사탑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탑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울어질 운명은 애초에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탑이 세워진 피사 일대의 지반 때문이다. 이 지역은 원래 습지였다가 간척한 땅이었고, 지반은 진흙, 모래, 점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건물을 지탱하기엔 매우 약했다. 1173년, 공사가 시작될
당시 기초 깊이는 겨우 3m. 높이 58.5m에 이르는 탑을 세우기엔 터무니없이 얕은 기초였다. 건물이 3층쯤 올라갔을 때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땅이 한쪽으로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한 것. 탑은 기울었고, 공사는 혼란에 빠지며 중단됐다. 기울어진 채로 중단됐던 공사는 100년 후 다시 시작됐고, 그 사이 건축가는 설계를 기울어진 상태에 맞게 수정했다. 탑의 중심축을 따라 수직으로 쌓지 않고,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은 계속 기울었다. 그렇게 3번에 걸친 공사, 총 200년에 가까운 시간 끝에 탑은 완성됐고, 완공된 후에도 탑은 계속해서 조금씩 기울어져 갔다.
그런데 왜 안 무너졌을까? 사실, 탑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던 순간이 있었다. 바로 1990년대. 전문가들은 “이대로 두면 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 드디어 본격적인 구조 보강 작업이 시작됐다. 강철 케이블로 탑을 기울어진 반대 방향으로 묶고, 콘크리트로 지반을 보강, 북쪽 지반에서는 물, 모래,
점토를 제거해서 무게 밸런스를 재조정했고, 800t짜리 납덩어리를 달아 탑이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도왔다. 이렇게 해서 2001년, 탑은 기존보다 4cm 정도 바로 서게 됐고, 오늘날까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탑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무게중심이 여전히 탑의 지지면 안쪽에 있기 때문이다. 무게중심이란 중력이 작용하는 한 물체가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중심이 지면 밖으로 벗어나면 물체는 넘어진다. 반대로, 중심이 지면 내부에 있다면 아무리 기울어져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개념이다. 돌탑을 쌓을 때 무게중심을 잘못 잡으면 금세 무너진다. 동전을 세우거나, 카드를 엇갈려 놓을 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무게가 무겁더라도 균형만 잘 맞추면 물체는 안정적으로 서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