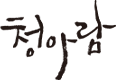수평선까지의 거리는?
가만히 수평선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저 거리는 얼마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의외로 그 거리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공식은 ‘모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 합과도 같다’라는 것. 수평선까지의 거리도 이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세 점은 수평선을 보는 사람의 눈, 원형인 지구의 중심, 보고 있는 수평선의 한 점이다. 이를 선으로 이으면 지구 중심에서 수평선까지 연결한 직선, 지구 중심에서 사람의 눈까지의 거리(사람의 키), 그리고 사람의 눈에서 수평선까지의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때 직각은 수평선에서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선과 수평선에서 사람의 시선으로 향하는 선이 만든다.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모르는 수는 오직 수평선까지의 거리다. 지구 중심에서 수평선까지의 지구 반지름은 대략 6,400km이다. 여기에 사람의 키를 170cm(=0.0017km)로 가정하면 빗변은 6,400.0017km가 된다. 이 수치를
공식에 넣으면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약 4.66476km, 대략 4.7km 정도다. 키 170cm의 사람이 보는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바로 4.7km 정도가 된다.
물론 이 계산은 이상적인 상황이다. 실제는 대기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대기는 위아래로 밀도가 달라서 빛을 굴절시킨다. 이 굴절은 우리가 보는 빛의
경로를 살짝 휘게 만들어 실제보다 더 멀리 있는 대상도 보이게 한다.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빛이 지구의 곡면을 따라 휘어져 보이기에 이를 고려하면 실제보다 더 멀리 수평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굴절 계수를 일반적으로 1.3으로 적용하면 170cm의 키를 지닌 사람이 보는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약 5.38km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바다에 선박, 함정이 떠 있는 거리는 얼마일까? 여기서는 선박도 일정한 높이가 있기에 그 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마스트나 레이더 돔 같은 구조물은 선박의 몸체보다 높게 있으니 더 멀리에서 살짝이라도 보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선박들은 곡률 계산을 반영해 설계되고 있다.
더욱 정밀하게 거리를 측정하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여러 방식으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가늠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거리는 점점 더 정확하게 측정됐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폴로 11호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선인 아폴로11호에는 사람 외에도 과학 장비들이 함께 실려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진계와 레이저반사경이다. 지진계는 달의 지진 활동을 관측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레이저반사경은 어떤 목적이었을까? 이 반사경의 정식 명칭은 ‘레이저 거리측정 반사장치(LR3, Laser Ranging Retro-Reflector)’다. 이름 그대로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다. 지구에서 쏘아 올린 레이저가 LR3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측정한 평균 거리는 약 384,000km. 현재까지 총 5개의 반사경이 달에 설치되어 있다. 몇 년에 걸쳐 관측한 결과, 달은 매년 지구로부터 3.8cm씩 멀어지고 있다.
이처럼 먼 우주에서도 사용되는 레이저는 일상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로봇청소기에는 다양한 센서와 함께 레이저 센서가 탑재됐다. 이 센서는 360°로 회전하며 레이저 빔을 발사하고, 레이저 빔이 벽, 가구 등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과 속도를 측정해 주변 공간을 파악한다. 이 덕분에 로봇청소기는
장애물을 피해 집 안을 청소할 수 있다. 최근 식당 등에서 자주 보이는 서빙로봇도 같은 원리로 식탁과 사람 사이로 움직이게 된다. 이 레이저 센서는 무기체계에도 탑재되어 있다. 전차에서 눈 역할을 하는 조준경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포함되어 있어 표적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 사격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또한 자주포, 소총, 유도무기, 드론, 잠수함 등 다양한 무기체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