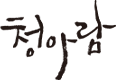해방과 전쟁, 그리고 미국의 구호물자(1948~1960)의 시대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한반도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에서 해방됐다. 미군정 시기, 연이은 벼농사의 흉작으로 인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3년여 동안의 한국전쟁은 한국인의 식생활을 극단의 궁핍에
이르게 했다. 피란민 중에는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적지 않았다. 정부와 유엔, 그리고 미국의 구호단체는 분유인 ‘유아 식량’을 별도로 공급해 주었다. 피란민 수용소에서는 분유에 옥수숫가루나 보릿가루를 넣고 물을 넣어 끓인 우유죽을 배급했다. 한국인 중에는 장(腸) 속에 유당(乳糖) 분해효소가
없어서 우유죽을 먹고 설사나 복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보관 중에 변질한 분유로 끓인 우유죽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쌀값은 몇백 배씩 폭등한지라 미국의 구호물자로 만든 우유죽이라도 먹으려고 매일 700~800명의 어린이·노인·병자가 우유죽 보급소 앞에서 줄을
섰다. 유엔군이 나눠준 초콜릿·껌·콜라·햄 따위를 먹어본 어린이들은 미국 음식을 동경의 대상으로 가슴에 품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밀·옥수수·콩은 정부의 분식장려운동과 맞물려 한국인의 식생활은 크게 변했다. 1964년부터 막걸리는 쌀 대신에 밀로, 희석식 소주는 고구마나 수입 당밀·카사바 등으로 빚었다. 1960년대 많은 한국인은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수제비·소면·라면 등으로 끼니를 대신했다.
미국산 콩으로 짠 콩기름과 찌꺼기 대두박을 먹고 자란 닭으로 통닭이 인기를 끌었다.
베트남 전쟁 참전과 중동 건설 붐(1961~1980)
한국에서 제조된 공장제 식품이 해외로 수출된 계기는 베트남 전쟁이다. 박정희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해 1964년 9월 11일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1964~1965년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장병들은 소고기가 듬뿍 들어 있는 미제 전투식량을 받고 매우 감격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군은 한국식 밥을
먹고 싶었다. 채명신 사령관과 지휘부는 미군과 베트남군 당국과 협의해 베트남 쌀로 밥을 짓고 전투식량(레이션)의 재료로 찌개나 국을 끓여서 장병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장병들은 김치·된장·고추장도 받기를 원했다.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에게 김치를 요청하자, 미국 정부는 잉여농산물을 받는 나라로부터 식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법규를 내세워 하와이의 일본인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공수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군 지휘부는 한국산 김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한미 양측은 장기간의 협의 끝에 1969년 6월 물물교환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았다. 1969년 가을, 마침내 한국산 김치가 남부 베트남의 항구에 도착했다. 군인들은 이것을 ‘K-레이션’이라고 불렀다. 더해 1967년 8월 삼양식품은 베트남에 라면 10만 개를 수출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 과정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의 무기화를 결의했고, 이에 따라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이후 중동 산유국은 경제적 수익을 엄청나게 올렸고, 오일머니로 도로와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1973년 삼환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해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 진출했다. 이때부터 1983년까지 100만 명이 넘는 남성 노동자들이 중동의 사막 현장에서 살았다. 한국 건설회사는 파견 노동자들에게 생활용품과 한국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운영했다. 이때 쌀·김치·고추장·된장·라면·어묵 등이 중동으로 수출됐다.
종합식품회사의 등장과 육류 소비 증가(1981~1987)
본격적으로 축육 소시지가 생산된 1980년 이전까지 한국인 대부분은 어묵 소시지인 분홍소시지를 먹었다. 1980년 가을에 한국의 종합식품회사 두 군데서 지금의 축육 소시지를 판매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햄·소시지로 만들던 부대고기찌개도 이때부터 한국산으로 대체됐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소갈비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는 1988년 겨울, 치솟는 소갈비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미국에서 갈비 270t을 긴급 수입해 시중에 공급했다. 1992년 2월 설날을 앞두고 서울의 유명 백화점 관계자는 미국산 수입 갈비에 ‘LA식 갈비’라고 써 붙였다. ‘LA식 갈비’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먹는 소갈비인 프랑켄 스타일 립(Flanken Style Ribs)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후 많은 한국인 가정에서 ‘LA 갈비’를 한국식 갈비찜이나 갈비구이로 소비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산 돼지고기에는 고약한 비린내가 나서 부유층에서는 즐겨 먹지 않았다. 정부는 양돈업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축산업 진출을 권유했다. 1976년 삼성그룹의 제일제당은 경기도 용인(지금의 테마파크 에버랜드 자리)에 기업형 양돈장을 열어 품종을 식용에 적당한 개량종으로
바꾸고, 배합사료를 먹이는 등 품질이 개선된 돼지고기를 생산했다. 돼지고기 부위 중 안심과 등심은 주로 일본에 수출했고 나머지 부위는 국내에서 유통됐다.
이때부터 삼겹살이 국민 고기로 떠올랐다.
북방외교와 IMF 경제위기 속에서 K-푸드의 해외 진출(1988~2013)
세계화의 시작은 냉전체제가 해체된 1992년부터다. 국경을 초월한 직접적인 교류와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상호연결이 세계화의 출발이다. 1992년 한국 정부는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이때 한국의 종합식품회사는 해외로 진출했다.
1992년 중국으로 향한 초코파이는 한국식 ‘정’ 대신 중국식 ‘하오펑이유(好朋友)’를 앞세운 광고와 함께 초코파이는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초코파이의 효시는 미국의 ‘문파이(Moon Pie)’다. 일본의 한 식품회사는 1958년 쫄깃쫄깃한 마시멜로를 넣고 겉에 초콜릿을 입힌 ‘엔젤파이’를 시판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제과업체들은 ‘엔젤파이’를 ‘카피’해 한국식으로 바꾸었다. 1996년 4월 초코파이는 중국 시장뿐 아니라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에도 진출했다. 한국화한 인스턴트라면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팔도 도시락’이 ‘처녀라면’이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당시 공산권 국가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한국 식품은 2000년대 이후 K-푸드 확산의 본격적인 출발이다. 1997년 11월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때 갑자기 늘어난 실직자와 퇴직자들은 떡볶이·즉석김밥·라면·맥주·도시락·치킨·제빵·제과·길거리음식 등 체인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국의 자영업자 체인 음식점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체인 음식점은 치맥, 떡볶이, 닭갈비와 같은 음식에 외국의 식재료를 융합해 한국형 글로벌푸드를 만들어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2000년대 이후 한류드라마와 K-팝의 세계적 인기는 한국의 음식점 메뉴와 공장제식품인 K-푸드를 세계 각지에서 통하는 글로벌푸드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글로벌푸드의 선두가 된 K-푸드(2014~2024)
2010년대 중반 이후, BTS를 비롯한 K-팝의 인기에 힘입어 K-푸드의 미국 식품시장 매출이 매년 급속하게 성장했다. 한국식 두부는 2018년 이후 미국 두부 시장의 약 74%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식 만두는 2019년 이후 미국의 만두 시장에서 중국업체를 제쳤다.
불닭볶음면은 제조 기업의 노력과 함께 매운맛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국내보다 해외에서 매출이 더 많은 K-푸드 선두주자다. 지방의 한 중소업체가 미국에 수출한 냉동김밥은 햄버거값보다 싸면서 비건식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미국 중하층 가정의 냉동고에 자리 잡았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이끈 또 다른 힘은 한국의 식품회사가 지닌 기술력의 우수성이다. 이미 세계 최고의 생산시설과 제품개발력을 갖춘 국내 식품회사는 가령 ‘달콤새큼한’ 맛의 절묘한 배합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냈다.
또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음식료품 제조업과 음식점업 종사자들이 외국 음식을 한국인의 입맛에 적용하려고 한 노력이다. 여기에 새롭고 생소한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옛것을 바탕으로 삼아 새것을 창조하는’ K-푸드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만들어 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K-푸드를 만들어 낸 힘이다.
![]() 글.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음식인문학자)
글.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음식인문학자)
![]() 일러스트. 이혜리
일러스트.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