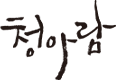1초에 담긴 많은 의미
너무 당연하게 쓰는 1초(s). 이 작은 시간 단위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옛날의 1초는 지구의 자전을 기준으로 정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를 86,400등분한 것이 바로 1초였다. 86,400이란 숫자는 하루 24시간 × 60분 × 60초 =
86,400초에서 나온 수치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쓰던 60진법이 오늘날까지 남아 ‘시–분–초’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지구 자전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세하게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면서 시간이 조금씩 틀어졌다.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956년 지구 자전 대신 태양의 공전 주기를 기준으로 초를 다시 정의했다. ‘1900년 1월 0일 12시를 기준으로 한 태양년의 1/31,556,925.9747’로, 이른바 ‘역표시(Ephemeris time)’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관측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로
이 또한 완벽하진 않았다.
과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기준을 찾으며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원자다. 1967년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1초의 기준을 세슘 원자의 특정 진동으로 변경했고, 지금 우리가 쓰는 초의 정의가 탄생했다. 수많은 원자 중 왜 세슘-133 원자일까? 그것은 세슘-133이 다른 원자보다 극도로 안정적이고 일정한
진동수를 지녀 언제 어디서든 같은 값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로 전 세계 공통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화된 과학적 시간 표준이다. 현재까지 이를 기준으로 1초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단어들은 어디서 왔을까? 모두 라틴어에서 비롯됐다. 시(hour)는 라틴어 ‘hora’에서 왔다. 이 뜻은 ‘시간의 한 시기’ 또는 계절을 뜻하는데,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낮과 밤을 12등분한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다. 분(minute)은 ‘pars minuta
prima’에서, 초(second)는 라틴어 ‘pars minuta secunda’에서 왔다. 각 라틴어는 순서대로 ‘첫 번째 작은 부분’과 ‘두 번째 작은 부분’이라는 뜻을 지녔다. 결국 시간의 어원은 큰 덩어리인 시를 잘게 쪼개며 만들어진 흔적이다.
이런 시간은 이제 더 잘게 쪼개져 미세한 순간을 다룬다. ms(밀리초, 1,000분의 1초), μs(마이크로초, 100만분의 1초), ns(나노초, 10억분의 1초), 더 나아가 ps(피코초, 1조분의 1초), fs(펨토초, 1,000조분의 1초), as(아토초, 100경분의 1초)까지 확장됐다.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시간까지 알게 되는 세상이 온 것이다.
시간과 관련된
또 다른 단위, 헤르츠
세슘-133으로 정의된 1초는 ‘바닥 상태의 두 개의 초미세 에너지 준위 사이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이 9,192,631,770번 진동하는 시간’이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쉽게 풀어보면, 세슘 원자 안에는 전자가 오갈 수 있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상태가 있는데, 이
사이를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빛(복사선)을 내거나 흡수한다. 그 빛이 정확히 9,192,63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1초’라고 정했다. 이 정밀한 시간을 재는 장치가 원자시계다.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에 전자파를 쏘고, 그 반응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주파수를 맞추는
원리로 작동한다. 그 값이 바로 9,192,631,770Hz. 여기서 ‘Hz(헤르츠)’는 진동수를 뜻하는 단위인데, 쉽게 말해 ‘1초 동안 몇 번 흔들리느냐’를 나타낸다.
진동이나 주파수라는 말,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만난다. 건강검진 때 받는 청력검사를 떠올려 보자. 들리는 쪽 귀에 맞춰 손을 들면 끝나는 청력 검사 말이다. 방음 부스에 들어가 헤드폰을 끼고 나면 ‘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때 들리는 소리가 바로 250Hz에서 8,000Hz까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순수한 소리다. 이를 통해 우리 귀가 어떤 주파수 범위까지 잘 듣는지를 확인한다. 집에서도 주파수를 사용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을 데우는 데 사용된다. 전자레인지는 2.45GHz라는 특정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물 분자를 흔들어 열을 만들어낸다. 덕분에 우리는 단 몇 분 만에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빠질 수 없는 게 와이파이다. 와이파이 증폭기에서 2.4GHz vs 5GHz라는 문구를 접한 적 있을 것이다. 둘 다 같은 와이파이지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속도와 도달 거리에 차이가 생긴다. 즉, 우리가 인터넷을 켜는 순간에도 주파수는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
Hz라는 이름은 독일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르츠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정작 헤르츠 본인은 자신이 발견한 전파가 ‘실생활에서 쓸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의 과학자들 역시 과학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쓸모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지녔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통신 기술은 걸음마 단계였고, 장비는 크고 비효율적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다시 세상에 와서 스마트폰, 위성통신, 무선 인터넷을 본다면 아마 자신이 증명한 ‘쓸모없던 파동’이 바꿔놓은 세상을 보고 놀랄지도 모르겠다.
생각보다 세밀한 조선의 시간
“그 아이의 웃음에, 하루 중 가장 화창한 오시의 햇빛에 생이 부서지던 순간이 떠오른 그때, 나는 결심했다.” 드라마 <도깨비>의 장면 속 대사다. 이 문장을 곱씹다 보면 쉽게 와닿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시’다. 극 중 도깨비인 김신은 고려의 장수였으니 그가 언급한
‘오시’는 당시의 시간 단위를 따른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아마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무렵에 해당할 것 같다. 그 근거는 예로부터 이어져 온 시간 체계인 십이지에 있다.
십이지는 육십갑자의 하위 단위로, 땅을 상징하는 지지(地支)라고도 불린다.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唇),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가 그것이다. 시간을 조선시대로 돌리면 하루를 십이지로 나누었는데, 각각에 ‘시(時)’를 붙여 총
12개의 시간을 만들었고, 한 시(時)는 두 시간에 해당한다. 즉, 자시는 23시부터 새벽 1시를 가리킨다. 이를 <도깨비> 대사에 대입하면,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가 된다.
정리하면 자시는 23~01시, 축시 01~03시, 인시는 03~05시, 묘시는 05~07시, 진시는 07~09시, 사시는 09~11시, 오시는 11~13시, 미시는 13~15시, 신시는 15~17시, 유시는 17~19시, 술시는 19~21시, 해시는 21~23시로 이어진다. 야간 경계 근무나 도성의 문을
여닫는 시간 통제에 사용한 밤의 시간은 5등분해서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이라 불렀다. 밤은 초경인 술시부터 시작해 인시인 오경까지 이어진다. 각 경은 계절에 따라 길이가 달라졌다. 겨울밤은 길어 경(更)의 시간이 늘어났고, 여름밤은 짧아졌다. 소위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부정시(不定時)’
체계였다.
시(時)는 다시 ‘초(初)’와 ‘정(正)’으로 세분된다. 앞선 1시간은 초, 뒤의 1시간을 정으로 불렀다. 자초(子初)는 23시, 자정(子正)은 24시를 뜻한다. 현재에서도 사용하는 밤 12시를 일컫는 자정의 의미는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낮 12시란 의미의 정오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십이지가 앞에 나오고 정이 뒤로 가야 하는 ‘오정(午正)’을 사용하지 않고 정오를 사용할까? 그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정과 정오 모두 낮 12시를 지칭하는 말이기에 어떤 말을 사용해도 의미는 맞다.
또 시(時)는 ‘각(刻)’으로 나뉜다. ‘일각, 이각, 삼각, 반각(2분의 1시), 오각, 육각, 칠각, 정각’으로 나누었는데. 한 각은 약 15분 정도다. 반각은 초시와 정시를 구별하는 경계다. 여기서 일각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다경(茶頃)’, 이각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식경(食頃)’이라고도 불렀다. 1각을 다시 10등분할 수 있는데 약 90초에 해당한다. 이 짧은 순간인 90초를 ‘경각(頃刻)’ 또는 ‘촌각(寸刻)’이라 불렀고, 지금도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거나 ‘촌각을 다투다’와 같은 표현으로 긴박한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인다.
![]() 참고. 《단위로 읽는 세상》 김일선 저 ┃ 김영사
참고. 《단위로 읽는 세상》 김일선 저 ┃ 김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