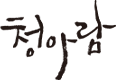맛없어야 살아남는다
키세스로 유명한 초콜릿 제조사인 허쉬가 한 때 ‘달지 않고 맛없는 초콜릿’을 대량 생산한 적이 있다. 판매가 잘될 리 없는 이 초콜릿은 무려 30억 개나 만들어져 보급됐는데, 이유는 단 하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식량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 연합군 병사들 사이에는 히틀러가 허쉬 공장에
잠입해 일부러 맛없는 초콜릿을 만들어 병사들의 사기를 꺾으려 한 게 아니냐는 농담까지 돌 정도였다. 일명 ‘히틀러 비밀무기’라는 오명도 붙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전투식량의 주력은 통조림이었다. 그때도 비상식량으로 작은 초콜릿이 제공됐지만 열과 습기에 약해 쉽게 녹아내리고, 오히려 맛이 너무 좋아 금세 먹어버려 비상식량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육군 군수사령부의 폴 로간 대령이 허쉬를 방문해 특별 주문을
한다. 조건은 네 가지였다. 무게는 4oz(약 113g), 고칼로리, 고온에서도 버틸 것, 맛은 삶은 감자보다 살짝 나은 정도일 것.
이렇게 탄생한 초콜릿이 ‘D-레이션(Ration)’이다. D-레이션은 약 49℃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았으며 한 개당 1,800kcal에 달하는 고열량을 제공해 전투식량으로 완벽했다. 단맛만 빼고 말이다. 너무 딱딱해 잘게 쪼개려면 총검이 필요할 정도였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고립된 전장에서 장병들에게는
유용한 생존 필수품이 되어주었다. 이후 조금 더 먹기 좋게 개선된 버전이 등장했는데 허쉬 트로피칼 초콜릿 바다. 이 초콜릿 바는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기브미 초콜릿”이라 외치며 받기를 희망했던 제품이다.
허쉬는 군의 요구에 맞는 완벽한 전투식량을 만들어냈다는 공로로 미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D-레이션의 생산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쟁에서 피어난 단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나 입는 옷 중에도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속옷조차 그 흔적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브래지어(Brassiere)다. 이 단어는 원래 옛 프랑스어 브라시에르(Braciere), 궁사가 팔목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던 보호대에서 유래했다. 중세 후기로 오면서 이 말은 팔목뿐
아니라 갑옷의 가슴 보호구까지 가리키게 됐고, 19세기에는 구명조끼나 조끼류 전반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그러다 오늘날 여성 속옷의 의미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금도 양궁에서는 팔목보호대를 브레이서(Bracer)라고 부르니, 최초의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코르셋(Corset) 역시 출발은 전쟁터였다. 어원은 라틴어 코르푸스(Corpus)로, 의미는 ‘몸’이다. 원래는 남성이 갑옷 안에 입던 몸통 보호구에서 비롯됐는데, 철갑이 직물로 대체되면서 이 옷이 여성에게도 전해졌다.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는 남성들조차 역삼각형 체형을 강조하기 위해 코르셋을
입었고,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를 통해 힘과 위엄을 드러내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용 코르셋은 사라지고, 여성의 체형을 돋보이게 하는 의복으로만 남게 됐다.
속옷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달력을 펼칠 때마다 만나는 3월(March) 역시 전쟁의 흔적을 품고 있다. 영어의 March는 고대 로마 달력에서 첫 달이었던 마르티우스(Martius)에서 왔다. 이는 곧 로마 전쟁의 신 마르스(Mars)의 이름에서 파생된 것이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겨울 동안 전쟁은 멈추었고,
봄이 되면 군사 행동이 다시 시작됐다. 자연의 회복과 농사의 시작, 그리고 전쟁의 개시가 모두 3월에 맞물렸기에 이 달은 군사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마르스는 단순히 전쟁, 파괴의 신이 아니라 로마 사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지키는 수호신이었기에, 그의 이름이 새해의 시작과 행군(March)이라는 단어 속에
함께 새겨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Freelancer)도 전쟁터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핵심은 ‘랜서(Lancer)’. 이 말은 긴 창(Lance)을 든 기병이다. 이들은 말 위에서 창을 다루는 기사 계급으로, 때로는 소속된 부대 전체를 가리키기도 했다. 중세에는 이 창기병들을 왕이나 귀족이 용병 회사(Company)를
통해 고용했는데, 특정 세력에 묶이지 않고 개인 계약으로 싸우던 이들이 바로 ‘자유 창기병’, 즉 프리랜서였다. 시간이 흐르며 이 단어는 소속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가를 뜻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