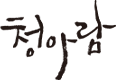스마트폰 속 내 위치 파악은 어떻게 알까?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열면 몇 초 만에 현재 위치가 표시된다. 이 기술은 극도로 작은 시간 단위인 ns를 다루기 때문에 가능하다. GPS 위성에는 1ns 이하의 오차만 허용하는 초정밀 세슘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다. 위성은 이 시계로 측정한 정확한 시각과 위치 정보를 지상으로 보낸다. 지상의 GPS 수신기는
신호가 발사된 시간과 도착한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 위성과의 거리를 측정한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신호의 특성상, 단 1ns의 미세한 시간 차이만으로도 수십c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한다. 우리가 보는 위치 정보는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그 정확도가 결정된다.
이러한 시간 기반 원리는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식 매매는 μs(마이크로초,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이루어지며, 은행 간 송금 시스템도 GPS의 시간 동기화를 활용한다. 5G 기지국 간 신호를 맞추는 데도 GPS 시각이 필수적이며, 수 ns의 오차만 생겨도 데이터 전송 품질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GPS는 인터넷이 없어도 위성과 수신기만 있으면 작동한다.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니라 시계 동기화를 위한 특별한 주파수 신호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GPS는 길 안내를 넘어 미사일·전투기·전투함 같은 첨단 무기체계에서 항법과 위치 정보의 핵심으로 쓰이고 있다. 결국 일상에서 ‘현재 위치
찾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작동하는 건 단순한 앱이 아니라 ns 단위의 시간 정밀도를 다루는 과학 기술이다.
주파수로 위험을 감지하다
1912년 4월 10일, 한 척의 배가 영국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출항한 지 나흘째 되던 4월 14일, 이 배는 북대서양 뉴펀들랜드 앞바다에서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이름과는 달리, 차가운 심해 속으로 가라앉으며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이야기 속 함선은 타이태닉호다. 이 사건은 인류에게 바닷속 장애물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사고 이전부터 소리의 반사, 즉 메아리(에코)를 이용해 빙산을 탐지하려는 연구를 진행하던 발명가 레지널드 오브리 페센든은 타이태닉호 사건을 계기로 수중 음파 탐지기의 초기 형태를 고안한다. 여기에 불을 지핀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독일의 U-보트 잠수함으로 인해 연합군은 큰 피해를 보았다. 이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선체에 납덩이를 달아 진동을 감지하거나 바닷속에 마이크를 넣는 등 다양한 초기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기술 발전의 핵심에는 압전효과가 있다. 특정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에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인데, 반대로 전기를 가하면 물질이 변형되어 음파를 방출하기도 한다. 이를 역압전효과라 한다. 소나는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다. 전기 신호를 받은 압전소자가 음파를 방출하면, 이 음파가 물속에서
이동하다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온다. 반사된 음파가 다시 압전소자에 닿으면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여기에 증폭 장치가 더해지면서 미세한 반사음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됐고, 소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오늘날 소나는 단순히 군사 장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태아를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부터 자동차 후방 주차 센서, 차량 속도 측정기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다. 물론 무기체계에서도 소나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수함을 잡기 위해 발전한 소나는 이제 잠수함 자체에 탑재됐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보고-Ⅲ Batch-Ⅰ 소나체계가 그 대표적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