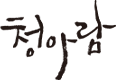반짝하고 사라진 무기들
제2차 세계대전은 특히 ‘반짝이는 무기’의 실험장이었다. 총알과 포탄이 하늘을 가르는 전장 뒤편에서는, 참호 속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거나 전황을 단번에 뒤집겠다는 발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하나가 독일의 크룸라우프(Krummlauf)였다. 이 무기는 총신을 30도, 45도, 심지어 90도까지 휘게
제작해 전차나 벽, 참호 뒤에서 몸을 숨긴 채 사격할 수 있도록 한 장치였다. 독일 돌격소총 StG44에 이 휜 총신과 잠망경식 조준 장치를 달아 병사가 몸을 드러내지 않고도 사격하도록 한 것이다. 구상은 훌륭했으나 현실은 냉혹했다. 발사 반동은 곡선 총열을 조금씩 풀어놓았고, 휘어진 총신을 지난 탄환은
정확도를 잃었다. 압력이 과도하게 쌓이면 총이 부서지기도 했다. 기술자들이 압력 배출 구멍을 뚫어 개선을 시도했지만, 사거리와 탄약의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결국 크룸라우프는 ‘휘어진 총열’이라는 기발한 발상만 남긴 채, 실전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무기도 있었다. 독일의 미스텔(Mistel)은 전투기 위에 폭격기를 얹은, 하늘을 나는 ‘합체 무기’였다. 상단의 전투기는 조종을 할 수 있었고, 하단의 폭격기는 조종석을 제거하고 폭탄으로 개조했다. 조종사는 목표 지점 근처까지 전투기를 몰고 간 뒤 폭격기를 분리해 목표물로 곧장
돌진시키는 방식이었다. 현대의 유도 미사일 개념과 닮아 있었지만, 무거운 폭격기를 공중에서 안전하게 분리·운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분리에 실패하면 조종사의 생명은 한순간에 위태로워졌다. 더구나 1944년 이후 독일이 제공권을 잃자, 미스텔은 공중으로 뜨기도 힘들어졌고, 결국 전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사라졌다.
이번에는 영국이다. 영국에서 아군에게 돌진하는 거대한 폭탄을 제작했다. 그 이름도 찬란했다. 그레이트 판젠드럼(Great Panjandrum). 대서양 방벽을 돌파하기 위해 고안된 ‘달리는 폭탄’이다. 대서양 방벽을 단숨에 뚫기 위해 고안된 이 무기는 지름 3m의 거대한 바퀴 양쪽에 수십 개의 로켓을 부착해
시속 약 100km로 해변을 돌파하도록 설계됐다. 발사 당일, 해변에는 장교, 기술자, 심지어 군 관계자 가족들까지 몰려들어 숨죽인 채 실험을 지켜봤다. 하지만 기대는 곧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발사 직후 판젠드럼은 굉음을 내며 앞으로 나아갔지만, 로켓 일부가 비대칭으로 연소하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괴물 같은
폭탄 바퀴는 돌진 경로를 잃고 곡선을 그리며 구경꾼 쪽으로 달려왔다. 장교들이 고함을 지르고 아이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날 이후, 판젠드럼은 다시는 실험대에 오르지 못했고, 전장에 나가기도 전에 폐기됐다.
손목에 시간을 채우다
전쟁이 바꾼 건 무기만이 아니었다. 시계 역시 전쟁과 깊게 얽혀 있다. 1510년, 독일 뉘른베르크의 시계 장인 피터 헨라인(Peter Henlein)은 최초의 회중시계를 만들었다. ‘뉘른베르크의 계란’이라 불린 이 시계는 18세기에 이르러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며 부와 품격의 상징이 됐다. 그러는 동안
손목시계는 드레스에 주머니가 없던 여성이 보석을 달아 장신구로 사용했다. 남성들은 손목시계보다는 회중시계를 일반적으로 이용했다. 남성이 회중시계를 사용했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다. 청바지 오른쪽 앞주머니 안쪽의 작은 ‘워치 포켓’이 바로 회중시계를 넣던 자리다.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찾아왔다. 전쟁 당시에는 참호공격이 주요 전술로 사용됐다. 화약 냄새가 짙게 깔린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었다. 공격 개시 시각을 맞추지 못하면 작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에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어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아니, 생명이 오가는
찰나의 순간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회중시계에 가죽끈을 달아 손목에 차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간단한 변형이 곧 전장을 지배하는 표준이 됐고, 손목시계는 군인의 생존 장비로 자리 잡았다. 전투 환경에 맞춰 손목시계는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야광 페인트가 칠해졌다.
시계 제조사들은 군인의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며 ‘손목시계는 남성의 상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오메가를 비롯한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군용 시계를 제작했고, 그 디자인과 기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쟁은 무기뿐 아니라 생활의 도구까지 바꿨다. 어떤 발명은 잠깐 빛나고 사라졌지만, 어떤
발명은 세월을 거슬러 오늘도 우리의 손목에서 시간을 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