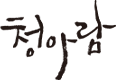태초에 소설부터 시작했으니
대부분의 발명은 소설, 영화 등에서 상상으로 시작한 경우가 많다. 레이저도 그랬다. 1960년 최초의 레이저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많은 SF 장르의 소설은 이미 레이저와 비슷한 형태의 무기들을 그리고 있었다. 물론 그때는 레이저라는 단어 대신 ‘광선(RAY)’ 등의 이름을 사용했었다.
그런 형태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98년 하버트 조지 웰스의 《우주전쟁》이다. 화성인의 전투 기계에 장착된 열선포(Heat Ray)는 거울에 집중된 에너지를 반사해 빔을 쏘는 형태였다. 같은 해 개릿 P. 서비스의 《에디슨의 화성 정복》에서는 토머스 에디슨이 개발한 분해광선으로 등장해 화성인과 맞선다.
소설 속 주인공인 토머스 에디슨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발명가가 맞다. 이후 1917년 빅터 루소의 《실린더의 메시아》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총 모양의 광선건(Ray Gun)이 등장한다. 이런 분위기가 실제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광선이라는 단어보다는 페이저(Phasers), 펄스
라이플(Pulse rifles), 플라스마 라이플(Plasma rifles) 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레이저건이나 광선검 같은 무기들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현실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빛은 특정 길이에서 멈출 수 없고, 고출력 에너지와 열 관리 부분도 난제였다. 하지만 과학의 한계는
상상력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SF 소설 속 레이저 무기가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스크린 속 아이콘으로
‘빰빰빰빰~ 빰~ 빠바바밤~ 빰~ 빠바바 밤~ 빠바바밤~’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영화가 없는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I Am Your Father”란 대사는 어떤가? 거의 레이저 무기 하면 클리셰처럼 생각나는 영화는 <스타워즈>(1977)다. 레이저 무기는 영화 속 제다이와 시스 등의 포스
센서티브들이
주로 사용하는 광선검인 라이트세이버(Lightsaber)다. 특유의 소리 ‘지잉~’하는 소리를 지닌 약 27cm 정도의 라이트세이버는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V: 제국의 역습>(1980)에서 루크 스카이워커와 다스 베이더가
행성 클라우드 시티에서 벌인 결투 장면이다. 이때 등장하는 대사 “I Am Your Father.” 당시의 충격적인 반전은 지금까지도 하나의 밈이 되어 회자됐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라이트세이버는 레이저가 아닌 플라스마 검에 가깝다고 한다. 초고온의 플라스마가 전자기장으로
제어되어 칼날 형태를 이루고, 이 플라스마가 길쭉한 실린더 형태로 압축되어 검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이트세이버는 ‘빛나는 칼’이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레이저 무기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 SF 드라마의 대명사이자 고전인 <닥터후>에서는 갈리프레이 행성 출신의 타임로드 종족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한 주인공 닥터의 상징 도구로 소닉 스크루드라이버가 등장한다. 이 스크루드라이버는 초음파 빔과 파동으로 문을 열거나 잠글 수 있는 만능 공구 같은 장비다. 그의 숙적인 마스터도 비슷한 모양의
스크루드라이버를 들고 다니는데, 공격용 레이저 스크루드라이버다. 이 장치는 레이저의 출력을 조절해 사용하는 강력한 드라이버로 선악의 대결 구도로 사용된다. 닥터를 위협하는 외계 종족 달릭도 레이저 무기를 사용한다. 데스레이라는 이름의 무기에서 발사된 레이저는 상대편을 완전히 말살한다.
또 다른 작품을 보면,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2004)의 주인공 막내 아기인 잭잭이는 눈에서 레이저 빔을 쏘며, 미국 드라마 <더 보이즈>(2019) 속 주인공 중 한 명인 홈랜드 역시 눈에서 강력한 레이저 빔을 발사한다. 이처럼 레이저는 한 세기가 넘도록 SF 장르의 대표적인 무기로 등장하고
있다.
예술에서 만나다
레이저는 강력한 무기로 파괴와 전투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출력 강도를 낮추면 관람객을 사로잡는 예술이 되기도 한다.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고 백남준의 야외 작품 <트랜스미션 타워>가 대표적이다. 2023년 국내에 최초로 공개된 이 작품은 8m 높이의 타워 사면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네온이 장착됐고, 꼭대기에는 레이저가 설치되어 있다. 방송 송신탑 형태의 타워들과 네온, 레이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빛을 통한 21세기 정보시대를 상징했다. 이 작품은 2002년 뉴욕 록펠러 센터와 2004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전시된 작품의 재현이었다. 동시대 아티스트들 역시 레이저를 예술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최근 윤제호 작가는 ‘이원공명’ 전시에서 레이저 빛, 전자기 신호, 사운드를 엮어 새로운 오디오 비주얼 경험을 선보였다.